《비유》 큐레이션
모과 한 알
책 표지의 앞날개에는 저자와 역자의 소개가 있고 뒷날개에는 이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다른 책들의 정보가 있다. 면지를 넘긴 후 마주하는 목차는 이 책에 대한 작은 지도이다. 지도에 표기된 페이지를 따라가면 궁금한 내용에 먼저 도착할 수 있다. 내게 ‘종이책’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낱장의 종이들이 표지와 면지, 목차와 본문을 통해 일련의 질서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물론 웹진이 종이책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초창기 디지털카메라가 기계식 카메라의 ‘찰칵’하는 셔터음은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핸드폰을 쓰지만 여전히 유선 전화기의 수화기 모양을 본뜬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처럼,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했던 시간을 떠올리도록 영화 포스터 속에 제목을 넣어 화면을 구성한 넷플릭스처럼, 각 페이지가 낱장으로 흩어지는 웹진이 굳이 종이책의 경험을 하나쯤 남겨둔다면 가장 알맞은 형태로 보였던 것이 바로 ‘연재’였다.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다시 읽어볼 만한 한국 소설의 한 장면을 캡처해달라는 《비유》 창간호의 ‘캡처’ 기획은 이런 고민 속에서 나왔다. 단행본 출간을 염두에 둔 장편소설이나 에세이 연재와는 조금 다른, 비평을 읽고 쓰는 이들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놓고 이어달리기 계주를 하듯 다음 필자에게 자신의 글을 바톤처럼 넘겨주는 것 말이다. 만약 기존의 ‘문학평론’이 조금은 다른 ‘비평’이 되려면 그건 필자보다 매체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캡처’ 기획은 《비유》 15호의 28회로 마무리되었지만 이제 나는 비유의 독자로서 아카이브의 장소에 쌓여있는 그 글들을 다시 열어보고 그 글이 막 발행되었을 때와 이를 다시 읽는 ‘여기’와의 간격을 재보곤 한다.
작품이 아니라 기획을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일반적인 문예지에서 ‘좌담’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 글자 ‘담談’이 전면에 등장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호기심이 일던 것이 떠오른다. 그중에서도 비유에 실린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나누었던 ‘비유-뷰view’ 기획은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의 페이지로 곧장 이동할 수 있어서 웹진에서만 가능한 ‘담談’이구나, 하고 즐거웠다. 발행일과 상관없이 여러 페이지를 오가면서 시간이 섞이는 것도 낯설어서 비평에게 동시대란 이처럼 넓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57호부터 62호까지, 시와 소설, 동시와 동화를 읽고 나누는 독자들의 수다는 언제든 끊어서 읽을 수 있고 어디서든 이어서 읽을 수 있었다.
창간호를 준비하던 2017년 어느 가을, 비유의 창간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비유》를 만들고 있는 남지은 선생님과 늦어진 저녁 회의를 끝내고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걷던 길이다. 갑자기 등 뒤에서 쿵, 하는 커다란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게 뭔지 보려고 어느 나무의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어두워서 한번에 알아볼 수 없었지만 어찌나 제대로 익었는지 그 강렬한 향 때문에 크고 무겁게 자란 모과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며 낸 소리라는 걸 알았다. 그후 《비유》에 접속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었다. 열매가 익어가는 동안엔 그토록 조용했으나 마침내 세상으로 던져지며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큰 소리와 무엇인지 눈으로 식별하기도 전에 강렬히 풍기던 그 모과의 향 말이다. 읽기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활발히 살아왔음을 뒤늦게 깨닫게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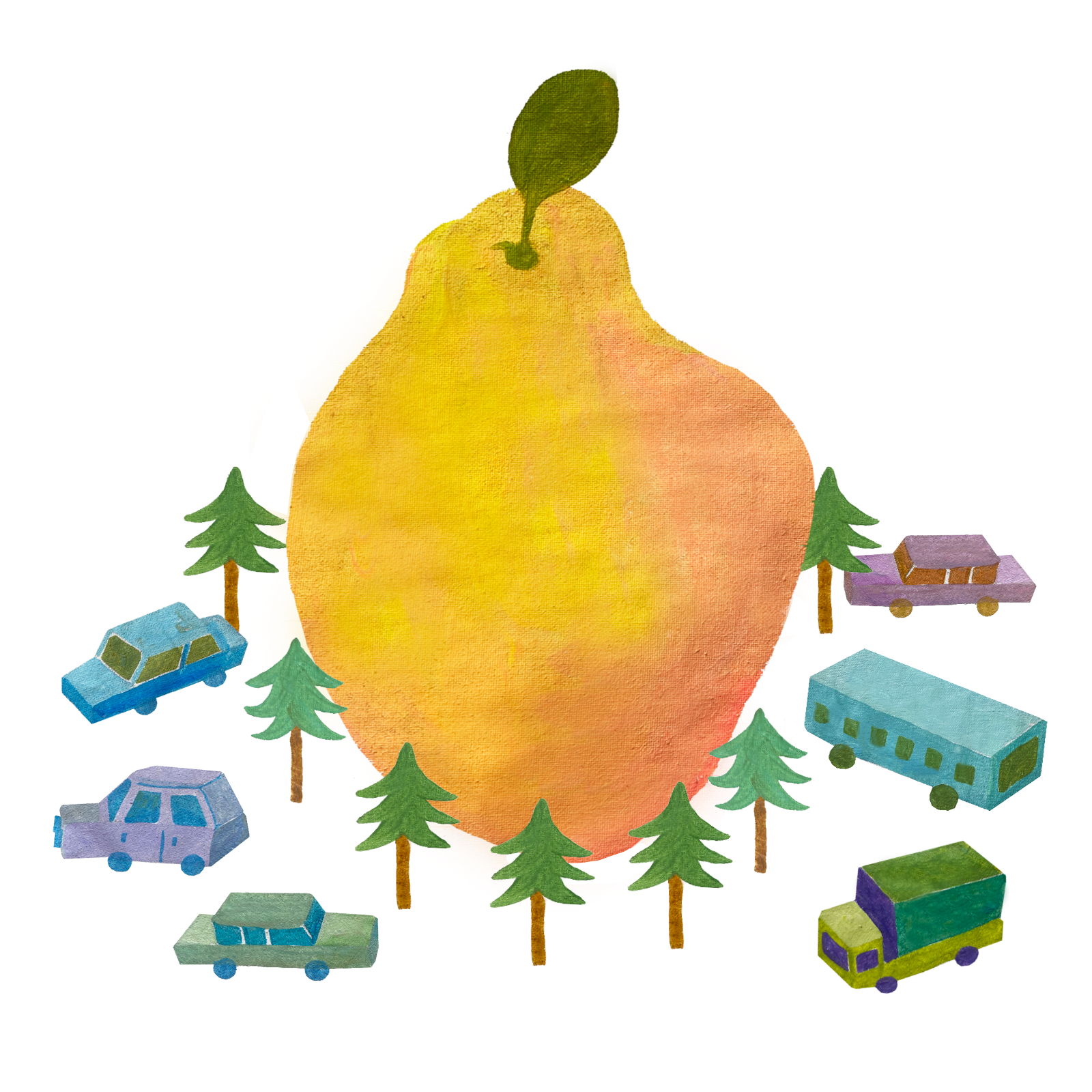
물론 웹진이 종이책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초창기 디지털카메라가 기계식 카메라의 ‘찰칵’하는 셔터음은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핸드폰을 쓰지만 여전히 유선 전화기의 수화기 모양을 본뜬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처럼,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했던 시간을 떠올리도록 영화 포스터 속에 제목을 넣어 화면을 구성한 넷플릭스처럼, 각 페이지가 낱장으로 흩어지는 웹진이 굳이 종이책의 경험을 하나쯤 남겨둔다면 가장 알맞은 형태로 보였던 것이 바로 ‘연재’였다.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다시 읽어볼 만한 한국 소설의 한 장면을 캡처해달라는 《비유》 창간호의 ‘캡처’ 기획은 이런 고민 속에서 나왔다. 단행본 출간을 염두에 둔 장편소설이나 에세이 연재와는 조금 다른, 비평을 읽고 쓰는 이들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놓고 이어달리기 계주를 하듯 다음 필자에게 자신의 글을 바톤처럼 넘겨주는 것 말이다. 만약 기존의 ‘문학평론’이 조금은 다른 ‘비평’이 되려면 그건 필자보다 매체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캡처’ 기획은 《비유》 15호의 28회로 마무리되었지만 이제 나는 비유의 독자로서 아카이브의 장소에 쌓여있는 그 글들을 다시 열어보고 그 글이 막 발행되었을 때와 이를 다시 읽는 ‘여기’와의 간격을 재보곤 한다.
2018년 1월호
1회 윤이형의 「피클」(소영현, 「못 믿을 말들-거짓말, 일기, 꿈, 상상」)
2회 오정희의 「유년의 뜰」(신수정, 「부네에게」)
3회 배수아의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백지연, 「도시와 여성」)
2018년 2월호
4회 정소현의 「양장 제본서 전기」(강경석,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의 가까운 전사(前史)」)
5회 이승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한영인, 「피해자의 자리를 넘어선다는 것」)
6회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김미정의 「무서워하는 소녀, 무섭게 하는 소녀」)
7회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차미령의 「여성의 기억, 그리고 역사」)
2018년 3월호
8회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백지은, 「모르는 아비」)
9회 천운영의 「바늘」(황종연, 「여성다움의 가면 아래」)
2018년 4월호
10회 배수아의 『동물원 킨트』(이경진, 「무성성의 시학이 처한 곤경」)
11회 배수아의 「영국식 뒷마당」 (권희철, 「내 생각에, 너도 그렇게 될 거야」)
2018년 5월호
12회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강지희, 「더 많은 젠더를 위해」)
13회 염상섭의 『불연속선』(서영채, 「여성 아니고 사람」)
14회 오정희의 「옛우물」(양윤의, 「여성과 토폴로지」)
2018년 6월호
15회 권여선의 「이모」(정홍수, 「희망을 말하는 방법—용서 없는 자세」)
16회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노대원, 「그렇게도 당신을 모른다」)
2018년 7월호
17회 김인숙의 「안녕, 엘레나」(원승종, 「나는 엘레나를 떠나보낸다」)
18회 손보미의 「몬순」(정지혜, 「사랑이라는 고질적인 신화」)
2018년 8월호
19회 강경애의 「소금」(신샛별, 「(내) 아이가 (나에게) 버려졌다」)
20회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은지, 「우리는 모두 김지영이다」)
2018년 9월호
21회 김성중의 「화성의 아이」(복도훈, 「화성을 젠더수행하기」)
22회 윤성희의 「어쩌면」(황예인, 「'따뜻한'을 빼고 그냥 유머」)
2018년 11월호
23회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윤재민, 「H.O.T(Highfive of Teenagers)」)
24회 최은영의 「몫」(조연정, 「충분히 빛나는 그녀들에게」)
2018년 12월호
25회 김혜진의 「아웃포커스」(박혜진, 「할머니의 무덤은 어디인가」)
2019년 1월
26회 윤이형의 「마흔셋」(노태훈, 「어쩌면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2019년 3월
27회 이광수의 『무정』(강동호, 「무정의 젠더적 무의식-병욱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28회 김인숙의 「양수리 가는 길」(김나영, 「어느 도중에」)
1회 윤이형의 「피클」(소영현, 「못 믿을 말들-거짓말, 일기, 꿈, 상상」)
2회 오정희의 「유년의 뜰」(신수정, 「부네에게」)
3회 배수아의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백지연, 「도시와 여성」)
2018년 2월호
4회 정소현의 「양장 제본서 전기」(강경석,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의 가까운 전사(前史)」)
5회 이승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한영인, 「피해자의 자리를 넘어선다는 것」)
6회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김미정의 「무서워하는 소녀, 무섭게 하는 소녀」)
7회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차미령의 「여성의 기억, 그리고 역사」)
2018년 3월호
8회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백지은, 「모르는 아비」)
9회 천운영의 「바늘」(황종연, 「여성다움의 가면 아래」)
2018년 4월호
10회 배수아의 『동물원 킨트』(이경진, 「무성성의 시학이 처한 곤경」)
11회 배수아의 「영국식 뒷마당」 (권희철, 「내 생각에, 너도 그렇게 될 거야」)
2018년 5월호
12회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강지희, 「더 많은 젠더를 위해」)
13회 염상섭의 『불연속선』(서영채, 「여성 아니고 사람」)
14회 오정희의 「옛우물」(양윤의, 「여성과 토폴로지」)
2018년 6월호
15회 권여선의 「이모」(정홍수, 「희망을 말하는 방법—용서 없는 자세」)
16회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노대원, 「그렇게도 당신을 모른다」)
2018년 7월호
17회 김인숙의 「안녕, 엘레나」(원승종, 「나는 엘레나를 떠나보낸다」)
18회 손보미의 「몬순」(정지혜, 「사랑이라는 고질적인 신화」)
2018년 8월호
19회 강경애의 「소금」(신샛별, 「(내) 아이가 (나에게) 버려졌다」)
20회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은지, 「우리는 모두 김지영이다」)
2018년 9월호
21회 김성중의 「화성의 아이」(복도훈, 「화성을 젠더수행하기」)
22회 윤성희의 「어쩌면」(황예인, 「'따뜻한'을 빼고 그냥 유머」)
2018년 11월호
23회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윤재민, 「H.O.T(Highfive of Teenagers)」)
24회 최은영의 「몫」(조연정, 「충분히 빛나는 그녀들에게」)
2018년 12월호
25회 김혜진의 「아웃포커스」(박혜진, 「할머니의 무덤은 어디인가」)
2019년 1월
26회 윤이형의 「마흔셋」(노태훈, 「어쩌면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2019년 3월
27회 이광수의 『무정』(강동호, 「무정의 젠더적 무의식-병욱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28회 김인숙의 「양수리 가는 길」(김나영, 「어느 도중에」)
작품이 아니라 기획을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일반적인 문예지에서 ‘좌담’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 글자 ‘담談’이 전면에 등장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호기심이 일던 것이 떠오른다. 그중에서도 비유에 실린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나누었던 ‘비유-뷰view’ 기획은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의 페이지로 곧장 이동할 수 있어서 웹진에서만 가능한 ‘담談’이구나, 하고 즐거웠다. 발행일과 상관없이 여러 페이지를 오가면서 시간이 섞이는 것도 낯설어서 비평에게 동시대란 이처럼 넓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57호부터 62호까지, 시와 소설, 동시와 동화를 읽고 나누는 독자들의 수다는 언제든 끊어서 읽을 수 있고 어디서든 이어서 읽을 수 있었다.
2022년 9월호
5회 김선오, 송승언, 하재연, 「비유-뷰view: 실패할 것이 분명한 퀘스트와 우울한 모험들(1)」
2022년 10월호
6회 김선오, 송승언, 하재연, 「비유-뷰view: 실패할 것이 분명한 퀘스트와 우울한 모험들(2)」
2022년 11월호
7회 김나영, 소영현, 이소, 이종산, 「비유-뷰view: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1)」
2022년 12월호
8회 김나영, 소영현, 이소, 이종산, 「비유-뷰view: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2)」
2023년 1월호
9회 김유진, 김준현, 송미경, 「비유-뷰view: 금간 뒤 밖으로 나와 반뜩 되살아난다」
5회 김선오, 송승언, 하재연, 「비유-뷰view: 실패할 것이 분명한 퀘스트와 우울한 모험들(1)」
2022년 10월호
6회 김선오, 송승언, 하재연, 「비유-뷰view: 실패할 것이 분명한 퀘스트와 우울한 모험들(2)」
2022년 11월호
7회 김나영, 소영현, 이소, 이종산, 「비유-뷰view: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1)」
2022년 12월호
8회 김나영, 소영현, 이소, 이종산, 「비유-뷰view: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2)」
2023년 1월호
9회 김유진, 김준현, 송미경, 「비유-뷰view: 금간 뒤 밖으로 나와 반뜩 되살아난다」
창간호를 준비하던 2017년 어느 가을, 비유의 창간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비유》를 만들고 있는 남지은 선생님과 늦어진 저녁 회의를 끝내고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걷던 길이다. 갑자기 등 뒤에서 쿵, 하는 커다란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게 뭔지 보려고 어느 나무의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어두워서 한번에 알아볼 수 없었지만 어찌나 제대로 익었는지 그 강렬한 향 때문에 크고 무겁게 자란 모과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며 낸 소리라는 걸 알았다. 그후 《비유》에 접속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었다. 열매가 익어가는 동안엔 그토록 조용했으나 마침내 세상으로 던져지며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큰 소리와 무엇인지 눈으로 식별하기도 전에 강렬히 풍기던 그 모과의 향 말이다. 읽기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활발히 살아왔음을 뒤늦게 깨닫게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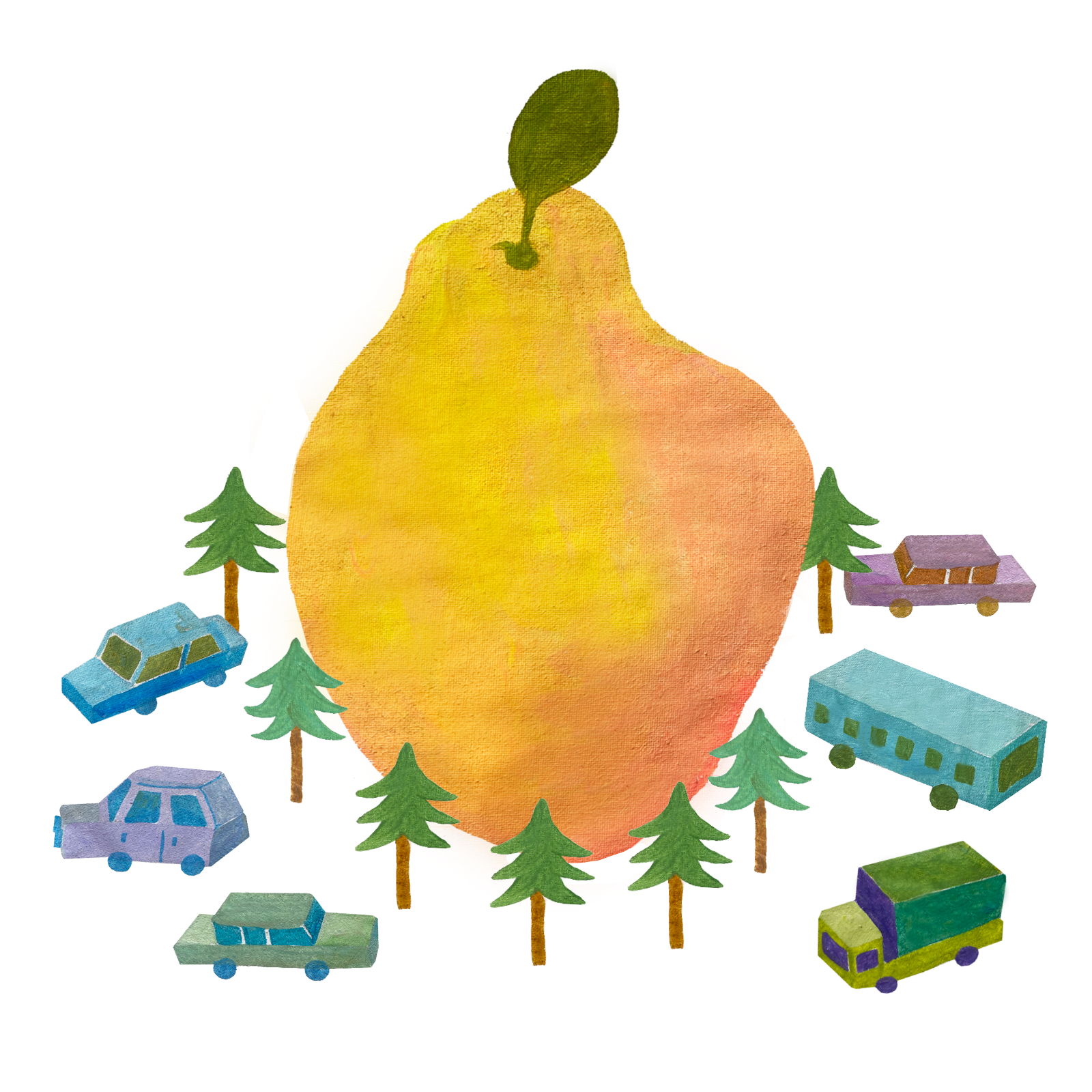
장은정
비평가. 《비유》 1호~39호의 기획자 중 한 사람.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