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식물 요양원
1.
학교가 끝나면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할머니 집으로 갑니다. 할머니 집은 우리 집과 멀지 않습니다. 나는 할머니 집에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있습니다. 엄마가 늦을 때는 할머니 집에서 저녁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고 숙제를 합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온갖 식물로 그득한 베란다에서 식물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매일 들여다보는 데도 매일 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달에 들여온 고무나무가 새잎을 냈어. 한 달 내내 잎을 축 떨구고 있어서 이대로 죽나 걱정했는데 말이야. 새잎을 냈으니 이 녀석 살 모양이다.”
지난달 분리수거 때 버려진 고무나무 얘기입니다. 할머니는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고무나무를 기어이 집에 들였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할머니네 집 식물들은 할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주워와 애지중지 키워낸 애들입니다. 할머니네 집 베란다는 식물 요양원이고 할머니는 요양원 원장님입니다.
할머니는 해질녘에도 한 번 물을 줍니다. 낮 동안 해를 받아 따뜻해진 물입니다.
“마시고 얼른 기운 차리시게. 영 시들시들하면 바로 땅에 묻어버릴 테니까.”
험한 말을 하면서도 할머니는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정성스러운 손길로 식물들을 돌봅니다. 그래도 때때로 시든 잎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잘라버립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라오. 마음 상했다면 툴툴 털어버리시게.”
할머니는 중얼중얼, 식물들에게 온갖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보름, 한 달이 지나면 기운 없던 식물들도 기운을 차리고 뾰족하게 하나씩 잎을 냅니다. 할머니는 손뼉 치며 세상 기특하다고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꼿꼿했던 만세 선인장의 허리가 굽었습니다. 할머니는 끌끌 혀를 찹니다.
“이 물 쭉 마시고 허리 좀 펴시게. 쭉쭉.”
할머니 말에 나도 허리를 쭉 폅니다.
기운을 차린 화분들은 새 주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금전수가 통통하게 살이 붙었다오. 데려가면 집에 재물이 들어올 거라오.”
할머니 한마디에 옆집 아줌마는 눈빛을 반짝이며 금전수를 데려갑니다.
“아기 엄마, 유칼립투스 하나 데려가봐요. 은은한 향기가 비염에도 좋다오.”
비염 때문에 고생하던 아기 엄마가 유칼립투스를 데려갑니다.
머리에 하얀 꽃이 내려앉은 할머니들에겐 제라늄, 게발선인장, 군자란처럼 꽃이 피는 식물이 인기가 많습니다.
가끔 일 년에 한 번씩 진짜 화분을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남아 있는 식물들을 놀라게 할까봐 어느 날과 똑같이 물 주고 쓰다듬다가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애들을 몰래 꺼내 아파트 화단에 묻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섭섭히 여기지 마오. 우리는 모두 한 줌 흙으로 돌아가니까.”
2.
갑자기 찬 바람이 불던 날,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던 식물들은 그날 종일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아픈 할머니를 내려다만 보았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발견한 건, 학교에서 돌아온 나였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할머니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19를 불렀습니다. 119가 오기 전에 금전수를 키우고 있는 옆집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아줌마가 흔들어도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엄마도 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따라가고 나는 집에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집은 갑자기 궁궐처럼 커졌습니다. 내 발소리까지 쿵쿵 울립니다.
베란다 한쪽 구석, 떠놓은 물이 보입니다. 조리개로 물을 퍼 올려 식물들에게 물을 줍니다.
흙에 고였던 물들이 사르르 사라집니다. 나도 목이 마릅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마저 물을 줍니다. 물을 얼마나 줘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나무도 꽃도 사람도 똑같다고요. 흙이 물을 꿀꺽꿀꺽 마시지 않는 건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든 억지로 하면 탈이 납니다. 무거운 조리개를 들다가 삐죽한 산세비에리아와 툭 부딪칩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말을 건넵니다.
“미안. 괜찮니?”
다정한 손길로 부딪친 부분을 만져줍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더욱 찬찬히 산세비에리아를 들여다봅니다. 방금까지 보이지 않던, 푸른 잎 사이에 수줍게 올라온 꽃대가 보입니다.
“어머!”
가까이 가니 은은한 향이 납니다. 산세비에리아 향기를 시작으로, 물을 머금은 식물들의 향기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식물들이 종알종알 말을 걸어오는 듯합니다.
오늘 내내 식물들도 마음을 졸였겠지요. 차가운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식물들은 꼼짝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알기에 할머니를 지켜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식물들을 온몸의 기운으로, 향기로 말을 겁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할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오래오래 식물들 향기를 맡고 쓰다듬었습니다.
3.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호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립니다.
할머니 손을 살며시 잡아봅니다. 손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한잔 건네고 싶은데 할머니는 코와 입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할머니 목마르지 않아?”
엄마가 내 어깨를 토닥입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지금 아픈 것도 못 느끼셔.”
나는 할머니 귀에 속삭입니다.
“기운 차려 할머니.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땅에 묻혀.”
내 말이 들렸을까요, 할머니 눈가에 잔주름이 잡힙니다. 우리가 웃을 때 똑같이 잡히는 개구쟁이 눈주름입니다. 이 눈주름은 할머니에게서 엄마로, 엄마에게서 나에게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누가 할머니에게 따듯한 햇살 한 줌, 물 한 모금을 준다면 할머니는 손가락 하나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할머니 병실에 갈 때마다 식물들을 하나씩 데려갑니다. 화분을 들고 갈 수 없으니, 가지 하나, 잎사귀 하나, 꽃 한 송이를 데려갑니다. 식물들은 할머니에게 가는 걸 아는지 가장 어여쁜 가지를 꺾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산소마스크를 벗기고 눈앞에 꽃을 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지요. 할머니 손가락 사이에 이제 막 꽃을 피운 동백꽃을 끼워줍니다.
할머니는 가늘게 눈을 뜹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 사이에 낀 동백꽃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아주 조금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나는 압니다,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 동백꽃에게 애썼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요.
동백꽃은 할머니와 마음이 통하는 걸까요, 쉬이 꽃잎을 떨구지 않고 오랫동안 할머니 손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작은 꽃 하나가 병실을 환하게 밝힙니다.
쓸쓸했던 마음이 그런대로 참을 만합니다.
4.
할머니는 식물들보다 먼저 땅에 묻혔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옷이며 그릇부터 시작해서 장롱이며 화장대 같은 세간살이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정리했습니다. 화분도 내놓겠다는 걸, 조금만 더 데리고 있자고 말렸습니다. 몇 달 사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식물들이 시들시들합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며칠이고 잘 돌봐주면 다시금 조그마한 싹을 보여줄 녀석들입니다.
내가 이제 식물 요양원 원장입니다. 식물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 집에 들러 수돗물을 받아두고, 날씨를 보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물을 주고 말을 겁니다.
“왜 이리 기운을 못 차려? 정신 못 차리면 할머니 따라서 땅에 묻힌다.”
식물들이 발끈해서 독하게 향기를 뿜어냅니다. 더 오래오래 살아낼 녀석들입니다.
할머니 집을 완전히 빼는 날, 화분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 둡니다. 누구한테 내보여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 자랐습니다. 새잎이 반짝이는 고무나무는 부동산 사장님이 가져갔습니다. 어지간하면 시들지 않는 다육식물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앞 동 꼬마가 데려갔습니다. 소나무 분재는 경비 아저씨가, 다년생 국화는 커피숍 사장님이, 이른 봄에 꽃을 피운 동백나무는 뒷동 할머니가 가져갔습니다.
하나하나 떠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넵니다.
인기가 없는 애는 잎이 하나도 나지 않은 행운목입니다. 잎이 하나도 없으니 나무토막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행운목에 코를 바짝 대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직은 희미하게 나무 향이 납니다. 그 향기를 맡으니 그대로 두고 올 수가 없었지요.
집으로 데려와 요리조리 살펴봅니다. 물에 푹 담가봅니다. 너무 물을 많이 먹으며 밑동이 무를까 싶어 다시 물을 따라냅니다. 햇빛 잘 받으라고 창가에 두었다가 너무 뜨거울까 싶어 책상 위에 둡니다. 나무토막처럼 그냥 굳어버리는 게 아닐까, 매일매일 행운목을 들여다보고 말을 거는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묻힌 공원에 갑니다.
행운목을 데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목을 쓰다듬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할머니 묘비 옆에 행운목을 심습니다. 엄마는 쓸데없다고 하지만 할머니라면 무슨 말을 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줄 겁니다. 다시 살아서 작은 잎을 틔워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할머니 곁에 묻힐 수 있으니 그것도 행복할 듯합니다.
알 수 없는 건 하늘에 맡겨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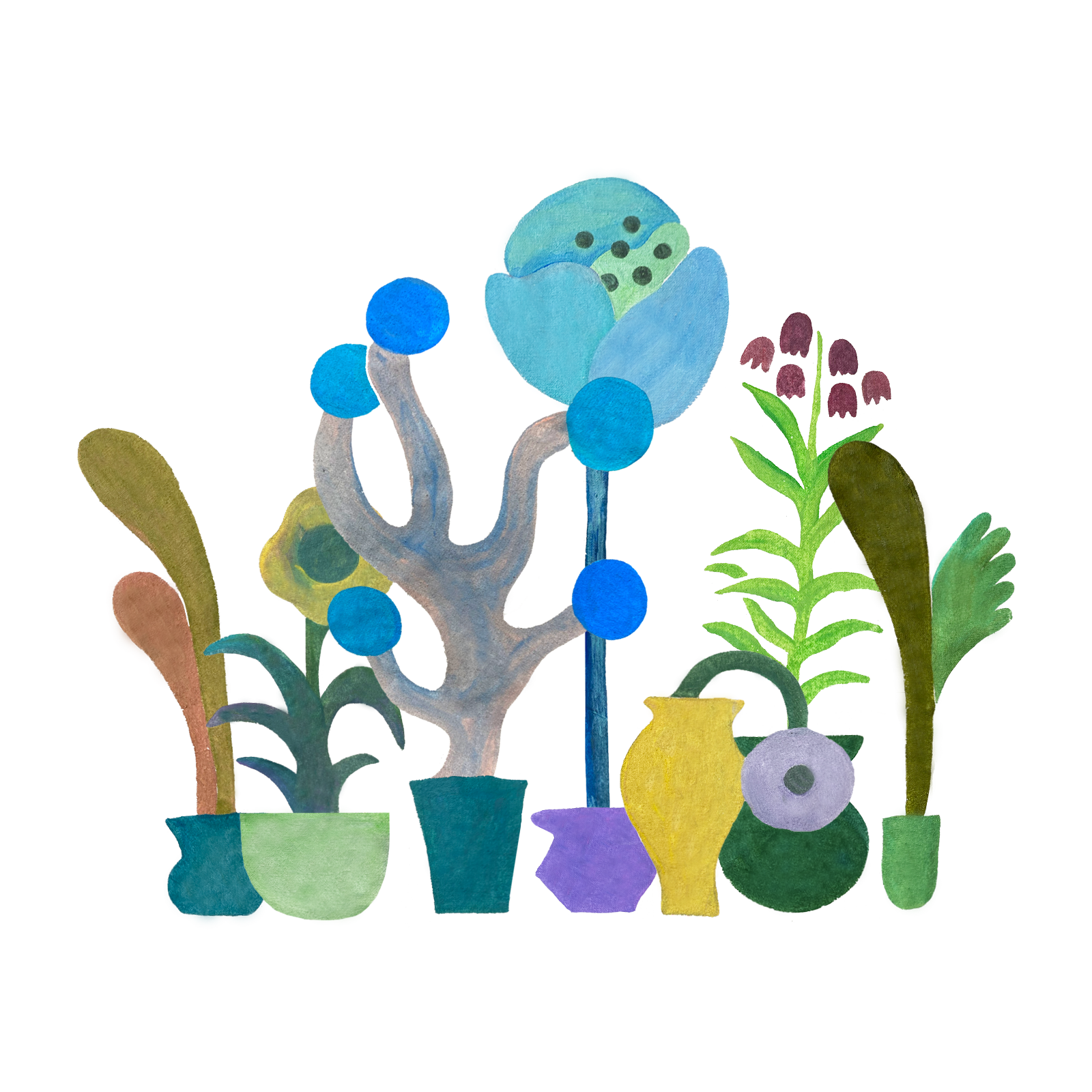 5.
5.
방과후에 가는 학원이 늘었습니다. 한가하게 보낼 할머니 집이 없으니까요. 바빠서 그런지 할머니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굽은 등이 느껴질 때면 “허리 쭉쭉” 하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라일락 나무 아래를 지날 때 코끝에 향기가 스칩니다.
여름날, 할머니 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훅하고 들이닥치던 식물들의 향기가 떠오릅니다.
‘식물들은 잘 살고 있을까?’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들려주던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너도나도 아우성치는구나. 하루를 더 살아서 좋다고 말하는 거 같지? 한 번 더 물을 마시고 한 번 더 햇볕을 쬐어서 좋다고 말이야.”
할머니가 라일락 꽃향기가 되어 내 옆에 머뭅니다.
크게 숨을 들이쉽니다. 한참 동안 라일락 나무 주변을 서성입니다.
여름이 한창일 때, 할머니에게 갑니다.
“맴, 맴, 맴.”
귀가 잘 안 들리던 할머니에게 매미들이 목청껏 말을 걸고 있나봅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땅속이 시원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묘비 옆, 행운목이 보입니다.
손톱만 한 작은 싹이 보입니다. 할머니가 행운목을 어르고 달래서 살려냈나봅니다. 할머니는 누가 뭐래도 요양원 원장님이셨으니까요.
쪼그려 앉아 행운목 새잎에 코를 바짝 들이댑니다.
새로 나온 이파리의 단단한 녹색 내음.
할머니 냄새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할머니 집으로 갑니다. 할머니 집은 우리 집과 멀지 않습니다. 나는 할머니 집에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있습니다. 엄마가 늦을 때는 할머니 집에서 저녁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고 숙제를 합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온갖 식물로 그득한 베란다에서 식물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매일 들여다보는 데도 매일 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달에 들여온 고무나무가 새잎을 냈어. 한 달 내내 잎을 축 떨구고 있어서 이대로 죽나 걱정했는데 말이야. 새잎을 냈으니 이 녀석 살 모양이다.”
지난달 분리수거 때 버려진 고무나무 얘기입니다. 할머니는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고무나무를 기어이 집에 들였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할머니네 집 식물들은 할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주워와 애지중지 키워낸 애들입니다. 할머니네 집 베란다는 식물 요양원이고 할머니는 요양원 원장님입니다.
할머니는 해질녘에도 한 번 물을 줍니다. 낮 동안 해를 받아 따뜻해진 물입니다.
“마시고 얼른 기운 차리시게. 영 시들시들하면 바로 땅에 묻어버릴 테니까.”
험한 말을 하면서도 할머니는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정성스러운 손길로 식물들을 돌봅니다. 그래도 때때로 시든 잎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잘라버립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라오. 마음 상했다면 툴툴 털어버리시게.”
할머니는 중얼중얼, 식물들에게 온갖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보름, 한 달이 지나면 기운 없던 식물들도 기운을 차리고 뾰족하게 하나씩 잎을 냅니다. 할머니는 손뼉 치며 세상 기특하다고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꼿꼿했던 만세 선인장의 허리가 굽었습니다. 할머니는 끌끌 혀를 찹니다.
“이 물 쭉 마시고 허리 좀 펴시게. 쭉쭉.”
할머니 말에 나도 허리를 쭉 폅니다.
기운을 차린 화분들은 새 주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금전수가 통통하게 살이 붙었다오. 데려가면 집에 재물이 들어올 거라오.”
할머니 한마디에 옆집 아줌마는 눈빛을 반짝이며 금전수를 데려갑니다.
“아기 엄마, 유칼립투스 하나 데려가봐요. 은은한 향기가 비염에도 좋다오.”
비염 때문에 고생하던 아기 엄마가 유칼립투스를 데려갑니다.
머리에 하얀 꽃이 내려앉은 할머니들에겐 제라늄, 게발선인장, 군자란처럼 꽃이 피는 식물이 인기가 많습니다.
가끔 일 년에 한 번씩 진짜 화분을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남아 있는 식물들을 놀라게 할까봐 어느 날과 똑같이 물 주고 쓰다듬다가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애들을 몰래 꺼내 아파트 화단에 묻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섭섭히 여기지 마오. 우리는 모두 한 줌 흙으로 돌아가니까.”
2.
갑자기 찬 바람이 불던 날,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던 식물들은 그날 종일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아픈 할머니를 내려다만 보았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발견한 건, 학교에서 돌아온 나였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할머니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19를 불렀습니다. 119가 오기 전에 금전수를 키우고 있는 옆집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아줌마가 흔들어도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엄마도 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따라가고 나는 집에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집은 갑자기 궁궐처럼 커졌습니다. 내 발소리까지 쿵쿵 울립니다.
베란다 한쪽 구석, 떠놓은 물이 보입니다. 조리개로 물을 퍼 올려 식물들에게 물을 줍니다.
흙에 고였던 물들이 사르르 사라집니다. 나도 목이 마릅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마저 물을 줍니다. 물을 얼마나 줘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나무도 꽃도 사람도 똑같다고요. 흙이 물을 꿀꺽꿀꺽 마시지 않는 건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든 억지로 하면 탈이 납니다. 무거운 조리개를 들다가 삐죽한 산세비에리아와 툭 부딪칩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말을 건넵니다.
“미안. 괜찮니?”
다정한 손길로 부딪친 부분을 만져줍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더욱 찬찬히 산세비에리아를 들여다봅니다. 방금까지 보이지 않던, 푸른 잎 사이에 수줍게 올라온 꽃대가 보입니다.
“어머!”
가까이 가니 은은한 향이 납니다. 산세비에리아 향기를 시작으로, 물을 머금은 식물들의 향기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식물들이 종알종알 말을 걸어오는 듯합니다.
오늘 내내 식물들도 마음을 졸였겠지요. 차가운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식물들은 꼼짝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알기에 할머니를 지켜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식물들을 온몸의 기운으로, 향기로 말을 겁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할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오래오래 식물들 향기를 맡고 쓰다듬었습니다.
3.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호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립니다.
할머니 손을 살며시 잡아봅니다. 손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한잔 건네고 싶은데 할머니는 코와 입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할머니 목마르지 않아?”
엄마가 내 어깨를 토닥입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지금 아픈 것도 못 느끼셔.”
나는 할머니 귀에 속삭입니다.
“기운 차려 할머니.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땅에 묻혀.”
내 말이 들렸을까요, 할머니 눈가에 잔주름이 잡힙니다. 우리가 웃을 때 똑같이 잡히는 개구쟁이 눈주름입니다. 이 눈주름은 할머니에게서 엄마로, 엄마에게서 나에게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누가 할머니에게 따듯한 햇살 한 줌, 물 한 모금을 준다면 할머니는 손가락 하나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할머니 병실에 갈 때마다 식물들을 하나씩 데려갑니다. 화분을 들고 갈 수 없으니, 가지 하나, 잎사귀 하나, 꽃 한 송이를 데려갑니다. 식물들은 할머니에게 가는 걸 아는지 가장 어여쁜 가지를 꺾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산소마스크를 벗기고 눈앞에 꽃을 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지요. 할머니 손가락 사이에 이제 막 꽃을 피운 동백꽃을 끼워줍니다.
할머니는 가늘게 눈을 뜹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 사이에 낀 동백꽃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아주 조금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나는 압니다,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 동백꽃에게 애썼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요.
동백꽃은 할머니와 마음이 통하는 걸까요, 쉬이 꽃잎을 떨구지 않고 오랫동안 할머니 손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작은 꽃 하나가 병실을 환하게 밝힙니다.
쓸쓸했던 마음이 그런대로 참을 만합니다.
4.
할머니는 식물들보다 먼저 땅에 묻혔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옷이며 그릇부터 시작해서 장롱이며 화장대 같은 세간살이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정리했습니다. 화분도 내놓겠다는 걸, 조금만 더 데리고 있자고 말렸습니다. 몇 달 사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식물들이 시들시들합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며칠이고 잘 돌봐주면 다시금 조그마한 싹을 보여줄 녀석들입니다.
내가 이제 식물 요양원 원장입니다. 식물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 집에 들러 수돗물을 받아두고, 날씨를 보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물을 주고 말을 겁니다.
“왜 이리 기운을 못 차려? 정신 못 차리면 할머니 따라서 땅에 묻힌다.”
식물들이 발끈해서 독하게 향기를 뿜어냅니다. 더 오래오래 살아낼 녀석들입니다.
할머니 집을 완전히 빼는 날, 화분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 둡니다. 누구한테 내보여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 자랐습니다. 새잎이 반짝이는 고무나무는 부동산 사장님이 가져갔습니다. 어지간하면 시들지 않는 다육식물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앞 동 꼬마가 데려갔습니다. 소나무 분재는 경비 아저씨가, 다년생 국화는 커피숍 사장님이, 이른 봄에 꽃을 피운 동백나무는 뒷동 할머니가 가져갔습니다.
하나하나 떠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넵니다.
인기가 없는 애는 잎이 하나도 나지 않은 행운목입니다. 잎이 하나도 없으니 나무토막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행운목에 코를 바짝 대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직은 희미하게 나무 향이 납니다. 그 향기를 맡으니 그대로 두고 올 수가 없었지요.
집으로 데려와 요리조리 살펴봅니다. 물에 푹 담가봅니다. 너무 물을 많이 먹으며 밑동이 무를까 싶어 다시 물을 따라냅니다. 햇빛 잘 받으라고 창가에 두었다가 너무 뜨거울까 싶어 책상 위에 둡니다. 나무토막처럼 그냥 굳어버리는 게 아닐까, 매일매일 행운목을 들여다보고 말을 거는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묻힌 공원에 갑니다.
행운목을 데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목을 쓰다듬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할머니 묘비 옆에 행운목을 심습니다. 엄마는 쓸데없다고 하지만 할머니라면 무슨 말을 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줄 겁니다. 다시 살아서 작은 잎을 틔워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할머니 곁에 묻힐 수 있으니 그것도 행복할 듯합니다.
알 수 없는 건 하늘에 맡겨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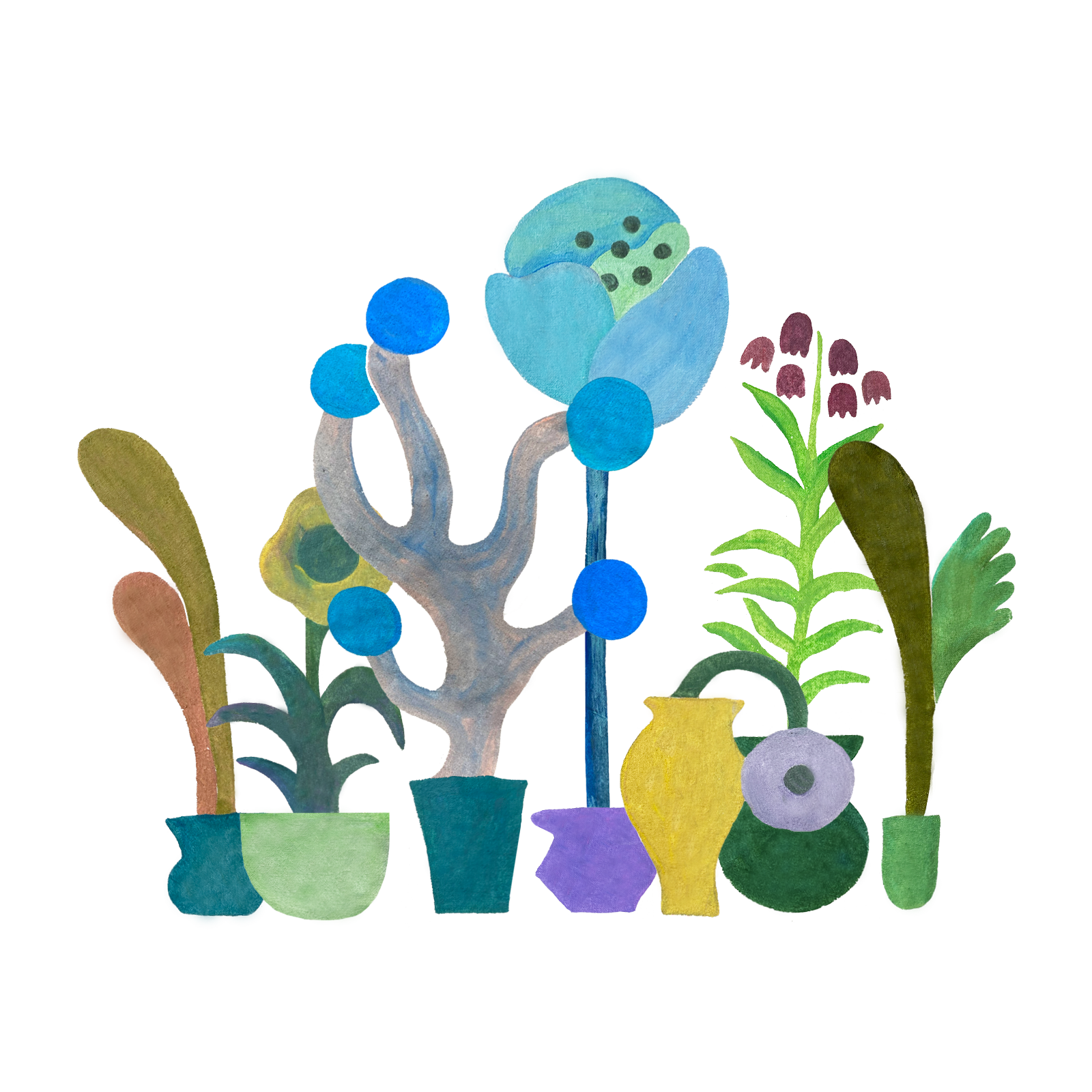
방과후에 가는 학원이 늘었습니다. 한가하게 보낼 할머니 집이 없으니까요. 바빠서 그런지 할머니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굽은 등이 느껴질 때면 “허리 쭉쭉” 하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라일락 나무 아래를 지날 때 코끝에 향기가 스칩니다.
여름날, 할머니 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훅하고 들이닥치던 식물들의 향기가 떠오릅니다.
‘식물들은 잘 살고 있을까?’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들려주던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너도나도 아우성치는구나. 하루를 더 살아서 좋다고 말하는 거 같지? 한 번 더 물을 마시고 한 번 더 햇볕을 쬐어서 좋다고 말이야.”
할머니가 라일락 꽃향기가 되어 내 옆에 머뭅니다.
크게 숨을 들이쉽니다. 한참 동안 라일락 나무 주변을 서성입니다.
여름이 한창일 때, 할머니에게 갑니다.
“맴, 맴, 맴.”
귀가 잘 안 들리던 할머니에게 매미들이 목청껏 말을 걸고 있나봅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땅속이 시원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묘비 옆, 행운목이 보입니다.
손톱만 한 작은 싹이 보입니다. 할머니가 행운목을 어르고 달래서 살려냈나봅니다. 할머니는 누가 뭐래도 요양원 원장님이셨으니까요.
쪼그려 앉아 행운목 새잎에 코를 바짝 들이댑니다.
새로 나온 이파리의 단단한 녹색 내음.
할머니 냄새입니다.
이소완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했고 동화를 씁니다. 쓴 책으로는『잃어버린 겨울 방학』 『맹물 옆에 콩짱 옆에 깜돌이』 『아이들이 줄줄이 이야기가 줄줄이』가 있습니다.
집 안 식물들을 알뜰살뜰 보살피지는 못합니다. 가끔 물만 흠뻑 주는데도 잎 내고 꽃 피는 식물들이 고맙고 기특합니다. 시들시들하면 시든 잎 따주고 물 주고 기다립니다. 보통은 다시금 잘 살아납니다. 베란다에서 보낸 시간이 쌓여,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4/08/21
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