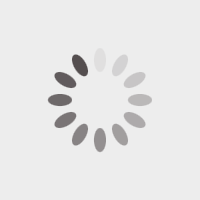고선웅의 초상 - 지금도 쓰고 있을 후배 작가들에게
(재)국립극단 <한국인의 초상>
이오진_극작가
제88호
2016.03.24
아래의 독백은 작년 10월 후배 작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고선웅 연출의 강의록과, <한국인의 초상> 공연 후 인터뷰, <한국인의 초상> 대본 및 프로그램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쓰다 울다 하고 있을 후배 작가들에게 <한국인의 초상> 공연보다 더 궁금한 것은, 선배작...
 고선웅 연출
고선웅 연출
아래의 독백은 작년 10월 후배 작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고선웅 연출의 강의록과, <한국인의 초상> 공연 후 인터뷰, <한국인의 초상> 대본 및 프로그램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쓰다 울다 하고 있을 후배 작가들에게 <한국인의 초상> 공연보다 더 궁금한 것은, 선배작가인 고선웅, 그리고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때
2016년 어느 봄날
공간
국립극단 '소극장 판' 앞 벤치
인물
고선웅(48)
<한국인의 초상>연출
극단 마방진 대표. 작가 겸 연출가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아리랑> <홍도> <변강쇠 점찍고 옹녀> 외
맥주와 안주를 놓고 마주한 봄날의 잔디밭.
한현주 작가, 이오진 작가, 장우제 사진가, 국립극단 최윤영 피디가 둘러앉았다.
선웅,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 선웅
- 오늘 좀 춥네. 바람 좀 부네. 아침에 나올 땐 완전 봄 같드니.
봄바람 이렇게 쌀쌀하니 맞는 거도 좋지.
<고선웅의 초상>을 쓴다고? (웃음)
내가 99년 신춘문예니까 작가 데뷔가 17년 정도 되었네.
연출은 중앙대 극회 영죽무대에서 스물한 살 때부터 했어.
94년부터 98년까지 광고 회사 다녔고.
99년에 신춘 데뷔해서는 작가만 몇 년 했지. 그땐 연출은 못했어.
연출들은 글을 쓸 줄 알아야 돼. 드라마적 와꾸를 알아야 연출을 하지.
그런 거 모르고 어떻게 연출을 해.
(필자에게) 작가라고? 요새 뭐해? 각색이랑 윤색?
그래, 그거 내공 쌓는데 도움 많이 될 거야.
작가들은 다 경험을 해 봐야 해.
다른 장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지.
'나 이런 거 안 써봤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야 잘 할 수 있는 거 같애.
겪어 봐야지. 좌절도 해보고.
좋은 작가는 좋은 프로덕션을 만나야 해.
프로덕션이 좋으면 작가가 좋은 결과물을 내 놔.
프로덕션이 안 좋으면, 작가도 갈 같이 없어지거든.
좋은 프로덕션이 나를 찾을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지
나 젊었을 때 글 쓰는 일 하면서 못 받은 돈이 6천만 원인가 될 거야.
글 값 진짜 많이 떼였어.
제작자가 대본 막 날리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그럼 난 대본 줍고.
돈도 못 받고.
그러면서 배운 것도 많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건 모르겠고, 난 그냥 그렇게 했어.
젊은 날에 사서 고생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젠 그런 제작자를 만날 일은 없네.
사실 이젠 딱 만나서 10분 얘기하면 겐또가 서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각색하면 원작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공포가 찾아 올 텐데.
수가 없어. 극복하는 수밖에.
작품은 단단한 의지를 갖고 만들어야 해.
"어떻게 해야 하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 번 해보자."하는 방법론으로 접근해야지.
좋은 생각 많이 해야 돼.
'내가 나쁜 의도를 갖고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공명을 얻으려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글이 안 풀릴리가'하는 낙관이 필요해. 너무너무 안 써진다. 그럼 그냥 용기 있게 노트북을 덮어. 그랬다가 작품 묵혀놓고 좀 있다 다시 봐.
사랑이 없이 꾼처럼 접근하면. 작품이 건조해져. 세상을 상대로 하는 선량한 의지가 없어.
보고 나서 언짢은 공연들 있잖아. 그게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면 그렇거든.
태도가 좋아야 해.

'관객들 이렇게 하면 웃겠지?'
'자, 이거 봐, 극적이지?'
그런 게 관객들 눈에 읽히면 기분이 안 좋지.
오래 가는 언어를 생각해 봐.
사랑.
낙관.
진리.
효도.
행복.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 그런 거 좋지.
공연 전까지는 작가가 대본을 제일 잘 알아.
그 다음에는 연출이 가장 잘 알지.
그 다음에는 배우가 제일 잘 알아.
종래에는 배우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연습 들어가고 나서 내가 생각한 그림을 바꾼다고 연출이 요구하면 잘 수용해.
수정해야 해. 서운해 할 일 아니야. 자존심 상해할 일 아니지.
피나 바우쉬(독일의 무용가, 1940-2009)가 그랬어.
"창작은 공포의 터널을 지나는 것" 이라고.
난 재능이 없나 봐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쓰지.
나는 뭔가.
세상에서 제일 쓸 데 없는 고민이야. 작가로서 자신이 없으면. 접어. 정 자신이 없으면 접어. 그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힘이 생겨. 머리로는 아무 것도 안 되고. 뱃속에서 생겨. 그럼 또 쓸 수 있어.
그냥 버텨. 안 써지면 한 줄이라도 쓰고, 용기 있게 노트북을 덮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해.
돈 벌어야겠다. 명예를 얻어야겠다. 히트를 쳐야겠다.
이런 거 말고.

"너도 돈 벌려고 잘 나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라고 누가 물으면
"아니? 아닌데?"
딱 나와야 돼.
아니, 작가는 돈 벌려고 작품 만드는 게 아니야.
내 글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글이 나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다 안 좋아해도 돼. 열 명에 한 명이라도!
우리 부모가 이 글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일이 일어나.
난 너무 못 써. 라고 규정하지 마.
'어? 이게 왜 안 풀리는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 해.
'아. 안 풀려. 죽고 싶어.' 이러면 안 추스러 져.
다시 말하지만,
용기 있게 노트북을 열고.
용기 있게 노트북을 덮고.
 <한국인의 초상>
<한국인의 초상>
공연 얘기 좀 해볼까.
<한국인의 초상>은…
글쎄,
한국인은 너무 많잖아.
어디까지로 규정해야 하나가 고민이었지.
그 많은 한국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한 편의 연극으로 담을 수 있을까,
공동창작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 만나서 연습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주옥같은 대사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12명의 배우들 다 처음 만났어.
27개의 에피소드는 연습 과정에서 즉흥으로 나온 걸 드라마로 만든 거고.
워낙 많은 몽타주라 촌철살인이 필요했고.
배우들 각자가 갖고 있는 이야기의 재가공이 필요했지
27개의 단상을 보여준 거야.
앞에 다 부정적인 거지. 대리 운전 셔틀, 폐지 줍는 노인, 짤짤이 순례길, 묻지마 범죄…
기분 좋은 거 마지막 하나야.
배우들 다 같이 해를 보잖아.
"해 보자, 해보는 거야"
이건 결말이 아니라
마지막 에피소드지.
다만 마지막 에피소드가 그 앞의 모든 것들을, 쳐낼 힘이 있는 거지.
왜냐면, '해'니까. "해 보자"는 거니까.
(작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소극장 판의 창문이 열리고 봄 햇살이 극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머리가 하얗게 샌 정재진 선배님이
무대 위에서 "내가 고2다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니킥을 날릴 때. 그걸 보는 거 자체로 카타르시스가 있잖아.
난 어떤 배우에게도 편견이 없어. 배우 하나하나 다 보석 같다고 생각해.
누가 잘하고 누가 덜 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연극하는 사람들은 자꾸 또래집단하고만 같이 있으려고,
말 통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는데.
그니까 맨날 고 나물에 고 밥인 작품만 나오는 거야.
나는 연출하는 선배님들 참 다 대단해.
오래 버티신 거잖아.
어르신이 후배한테 '연극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 기분 탁 나빠져 가지고.
술자리에서 '오늘 일 있어요' 하고 빠지고.
술자리에 몇 번 붙어 있어야.
'에이, 선배님 그 얘기 좀 고만하세요~"가 되지.
몇 십 년 연극 한 선배한테 그 동안 어떻게 버텼냐, 묻고
그 대답이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 기회를 놓치는 거지.
인생을 얘기하는 거지, 스킬을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한국인의 초상>
<한국인의 초상>
작년에 연출가로 주목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다만 하나. 후배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글을 썼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더라고.
내가 걸어와 보니,
여기 돌이 있더라.
저기는 숲이 너무 우거졌고.
저기는 늪이더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지지.
그래도 어차피 힘든 건 다 똑같애. 똑같긴 한데.
그냥 혼자 가도 알게 되지만.
그 돌/숲/늪을 알고 걸으면,
다른 더 멋진 길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세대 간의 교감이란 게 그런 거겠지.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 그래도 좀 더 사랑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
다들 뭘 해. 뭘 좀 하긴 해.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가슴이 따뜻해지거나 하는 느낌은 잘 안 들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
증명은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어떤 이야기든, 어떤 거든. 증명이 되는 구조 속에서 창작 작업을 해야 하는 건데. 스스로가 고독하게 증명을 하려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증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다만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 생활고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창작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
그럼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작가가 ‘애타게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해.
자기가 애가 안탔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
후배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자꾸 자꾸 사랑해야 돼. 사랑 말고는 답이 없는 거 같아.
진짜로 하다 하다가 내린 결론이야.
연극은 사랑이구나. (웃음) 미안해. 내가 이런 말해서.
내가 이 '사랑' 이라는 말을 깨닫는데 3년이 걸렸거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작가들이 건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연출가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사랑하는 배우가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지.
잘 안 돼.
심장으로, 마음으로, 훅 오기 전까지는.
작가도 연출도 배우도 다 마찬가지야.
여튼.
뭐.
좋은 작가가 되슈.
다시 말하지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어요. 끝.
(웃음) 술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
끝.
[사진: 장우제 woojejang@gmail.com & (재)국립극단 제공]